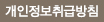-
제10회 퇴계선생의 별세 - 무등산 규봉에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19
꿈에 퇴계 선생을 뵙다.
지난밤에 어렴풋이 스승을 모시었고 / 前夜依俙杖屨陪
오늘 밤에도 정답게 웃고 말씀하시었네. / 今宵款曲笑談開
분명한 생각으로 아직도 세상 걱정하시니 / 分明一念猶憂世
선생께서 매화에만 집착 않으심을 알 수가 있네. / 可識先生不著梅
선생께서 일찍이 “도산{陶山]의 매화가 아직 피지 않았지만 지금쯤은 필 때가 되었다.”고 하시기에, 대승{大升}이 말하기를 “산림{山林}에 집착하시는 것도 성곽{城郭}에 집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하고,
서로 우스개 소리하며 웃은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끝 구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원주]
고봉은 퇴계 선생과 헤어진 후 꿈에서도 자주 퇴계를 만난다. 광주로 낙향하여 인생살이 생각을 하니 퇴계 선생이야 말로 자기를 가장 아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새삼 느껴서 였을까. 고봉은 퇴계와 1569년에 한강에서 이별한 후로 자주 꿈 속에서 퇴계를 뵈었고, 퇴계를 생각하며 위 시를 지어 그에게 올린다.
그런데 1570년[선조3년] 12월 8일, 조선 유학의 수퍼스타 퇴계 이황은 경상도 안동의 도산에서 별세한다. 매화를 누구보다도 사랑한 그는 죽기 전에 '내가 설사를 하여 저 매화에게 미안하다. 다른 곳으로 치우라.’는 말을 유언인양하면서.
퇴계는 밀봉된 다섯 가지의 유언을 글로 남긴다.
그 유언 중에는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말도 들어 있다.
비석을 세우지 말라. 다만 작은 돌에다 앞면에는 퇴도만은진성이공지묘(도산으로 물러나 만년을 숨어 산 진성이씨의 묘)라고 쓰고 그 뒷면에는 세계 {世系}와 출처의 대략을 <가례>에 언급된 대로 간략하게 기록해라.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짓게 되면 잘 아는 사람 중에 기대승같은 사람은 반드시 실속 없는 일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아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안동 건저산 기슭에 있는 퇴계의 묘소 앞 비석의 앞면은 그의 유언대로 ‘퇴도만은진성이씨지묘’라는 10자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벼슬 이름도 그에 대한 찬사도 없다. 다만 ‘도산으로 물러나 만년을 숨어 산 진성이씨의 묘’라고 적혀 있다. 그의 겸허함이 너무나 돋보이는 비문이다.
그러나 비석의 뒷면의 명문{銘文}은 그의 유언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의 우려대로 기대승이 글을 짓고 글씨를 쓴 것이다. 기대승은 이 비문 글에서 그가 퇴계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비명을 쓴 이유도 함께 밝히고 있다.
일찍이 고봉은 퇴계 선생이 살아 있을 때 퇴계의 부탁으로 퇴계의 아버지 묘갈명을 지은 바 있다. 그런데 퇴계는 돌에 문제가 있어서 살아생전에 아버지 묘비를 세우지 못하였다. 퇴계는 이 일도 유언으로 남긴다.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 선친 묘비를 문중 사람들과 의논하여 세우라고 한 것이다.
퇴계가 별세할 때 고봉은 광주에 있었다. 그는 사람을 보내 조문을 하면서 제문을 쓰고 만장을 짓는다. 그가 쓴 제문에는 퇴계 선생을 잃은 비통함이 진하게 배어 있다.
아, 애통합니다. 대들보가 꺾이고 태산이 무너졌으니, 제가 다시 어떻게 가슴을 가누겠습니까. 위로는 사문{斯文}이 땅에 떨어짐을 애도하옵고, 아래로는 만학{晩學}이 의지할 곳을 잃음을 슬퍼하오니,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뼈가 놀라고 혼이 날아가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략]
어찌 인간의 일을 기약할 수 없어서 갑자기 부음{訃音}을 받는단 말이옵니까. 애통하여 사모하면서 길이 울부짖으니, 가슴은 답답하고 답답하여 더욱 서글퍼집니다.
천리 먼 길에 애도하는 말을 엮어서 한 술잔에 부치오니, 애통하여 저의 정을 다할 수 없사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선생의 영령께서는 행여 저의 작은 정성을 굽어 살피소서. 아, 애통하옵니다. 흠향하소서.
[제문]에서
1571년[선조 4년] 3월 21일 퇴계 이황의 장례가 있던 날, 고봉은 멀리서나마 인사를 하려고 한 것인지 여러 제자들과 함께 무등산 규봉에 올랐다. 이 날 고봉은 ‘퇴계 선생의 장례날에 문수암에서[원제는 ‘느낌이 있어 감흠{感欽}’이다]’란 시 세수를 짓는다.
선생은 세상이 싫어 백운향에 가셨는데
천한 제자는 슬픔 머금고 이곳에 있네.
멀리서 생각하니 오늘 무덤에 묻히실 텐데
사방의 궂은 안개가 차츰 아득해지네.
先生厭世白雲鄕 선생염세백운향
賤子含哀在一方 천자함애재일방
遙想佳城今日掩 요상가성금일엄
四山氛霧轉茫茫 사산분무전망망
백운향은 장자의 [천지]에 나오는 글이다. ‘저 흰 구름 타고 상제의 고을에서 놀리라’라는 구절이 나오는 데 흰 구름 타고 가는 고을이 바로 백운향이다.
선생은 세상이 싫어서 상제의 고을 즉 하늘나라로 가시었는데
나는 슬픔에 젖어 이곳에 있네.
멀리 호남의 무등산 규봉에서 생각하여 보니
지금 선생님은 영남 안동에 묻히실 텐데
사방에 둘러 있는 산에 안개가 끼어서
먼발치로나마 영남 땅을 볼 수가 없네.
한 기운이 유유하게 갔다가 돌아오니
화려한 집에서 황천으로 떨어짐을 어찌 견디랴.
산머리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이 아프니
쇠약한 몸 백발 여생이 외로워졌네.
一氣悠悠往又回 일기유유왕우회
可堪華屋落泉臺 가감화옥낙천대
山頭不覺中心痛 산두불각중심통
衰白餘生踽踽來 쇠백여생우우래
병이 많아 근년에는 몸조심을 하니
우연히 봄빛 따라 선방에 이르렀네.
우리 도학이 땅에 떨어짐을 상심하노니
누구를 공경하며 다시 향기 기를꼬.
多病年來效括囊 다병연래효괄랑
偶隨春色到禪房 우수춘색도선방
傷心吾道今墜地 상심오도금추지
敬爲何人更畜香 경위하인갱축향
고봉은 퇴계가 없는 세상에서 낭떠러지에 홀로 서있는 고아가 된 느낌이다. 태산이 무너졌으니 이제 누구를 공경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산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랬을까. 고봉도 퇴계가 돌아가신 후 2년도 채 못 되어 이 세상을 떠난다.
한편 이 시에는 원주가 달려 있다.
1571년 3월 21일에 고봉 기대승은 무등산{無等山} 규봉{圭峯}의 문수암 {文殊菴}에서 쓰다. 이날 퇴계 이황 선생의 장례가 있었다. 느끼는 바가 있어서 우연히 이 시를 썼다.
[원주]
이런 일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2월에 무등산 규봉을 올랐다. 규봉은 경치가 너무나 좋다. 규봉{圭峯}의 규자는 흙토 자가 두개 겹친 글자라 그런지 층암괴석이 가히 빼어나다. 특히 광주 인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지어진 이 암자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모든 것을 압도한다.
그런데 고봉이 시를 썼다는 장소인 문수암을 찾을 수가 없다. 무등산 관리사무소 직원등 여러 사람에게 문수암이 어디 있는 지를 물었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등산을 마치고 난 며칠 뒤에 나는 우연히 제봉 고경명[1536-1592]의 무등산 기행문 [유서석록{遊瑞石錄}]에서 문수암 기록을 찾았다.
[규봉] 광석대의 서쪽 길에는 문지방 같은 돌이 가로질러 있는데 이들을 넘나들면 문수암이다. 암자 동쪽 기슭에 오목하게 패인 돌이 들어 있어 그 중앙에서 샘이 솟아나오며 돌 틈에는 석창포가 수북이 피어 있고 그 앞에는 높이와 넓이가 수십 척 되는 바위가 있다
규봉을 내려오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고봉은 퇴계와 몇 번 만났는가 하는 점이다. 고봉연보와 고봉과 퇴계의 편지를 읽어 보면 고봉은 1558년 10월에 서울에서 퇴계를 처음 만났고, 1567년 7월의 어느 날 밤에 두 번째 만났다고 적혀 있다.
이 즈음의 고봉의 편지 글 중에는 ‘뵙고 나서 다음날에 성균관에 들어가시는 것을 먼발치로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568년 7월에 선조가 안동에 있는 퇴계를 서울로 부르자 퇴계는 별수 없이 서울로 올라와서 1569년 3월까지 서울에서 머무른다. 이 시기에 고봉은 퇴계를 만났다고 되어 있고, 퇴계의 제자 우성전[1542-1593]도 1568년 겨울에 퇴계와 고봉과 우성전이 같이 만났다는 기록을 [퇴계 언행록]에 적어 놓고 있다.
그리고 1569년 3월, 퇴계 선생이 임금의 윤허를 받아 벼슬을 사직하고 영영 서울을 떠날 때 퇴계와 고봉은 봉은사에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이별을 한다.
이를 보면 고봉은 퇴계 선생을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정도 직접 만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봉은 1558년부터 1570년까지 13년간에 편지를 통하여 퇴계 선생을 극진히 모시었고 퇴계도 고봉을 극존칭을 쓰면서 까지 대접하고 가장 아끼었다. 퇴계와 고봉과의 만남은 정말 아름답다. 향기 나는 만남이다.
- 첨부파일 |
- 문학기행_10회분_사진.hwp